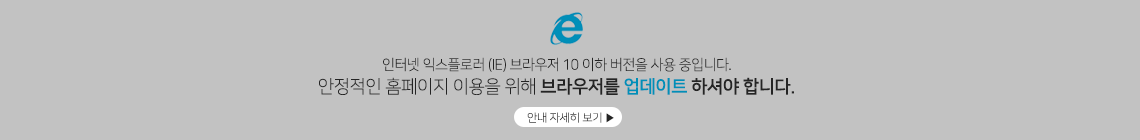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오늘의 만남> 튀김 부스러기
작성일2025년 12월 03일

내 나이 예닐곱 무렵으로 기억한다. 어머니가 버스로 삼십 분쯤 걸리는 큰 시장에 갈 낌새가 보이면 나는 서둘러 채비를 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꽤나 필사적인 각오로 덤볐다. 어머니는 그런 나의 의도를 알아채고 순순히 동행을 허락했다.
어린 녀석이 그렇게 기를 쓰고 먼 길을 따라나선 이유는 시장 한편 분식점에서 파는 우동 때문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우동에 고명으로 올린 튀김 부스러기였다.
당시 나는 그 튀김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다. 다만 처음에는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시간이 좀 지나서는 우동 국물을 머금은 녹진녹진한 맛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황홀했다.
‘이거였구나…….’
어린 내 입맛을 사로잡았던 황홀한 음식의 정체가 고작 무료로 나눠 주는 튀김 찌꺼기였던 것이다. 환상은 그렇게 허망하게 깨졌다.
하지만 추억은 힘이 세다. 나는 지금도 우동집에 가면 튀김 부스러기를 듬뿍 올려 달라고 한다. 국물에 기름이 둥둥 뜨고, 개운한 맛이 탁해져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맛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 직업은 음식과 식재료를 탐구하고, 사람들의 기호를 분석하는 일이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훈련과 경험을 통해 남다른 미각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 봐야 내 미각과 전문성은 고작 튀김 찌꺼기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인생의 음식이란 그런 것이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이 깃들었기에 이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 혼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가끔은 사무치게 그리운 음식이다.
글 _ 박상현 님 | 맛 칼럼니스트
사진 출처 _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