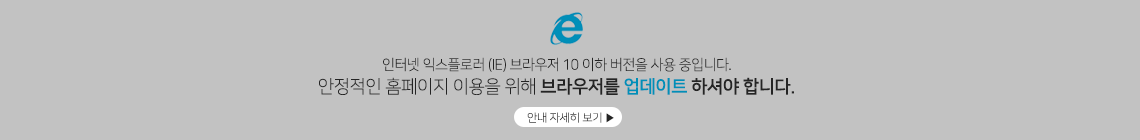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오늘의 만남> 끄리 회 한 점
작성일2025년 11월 26일

아카시아꽃 냄새가 흐르고, 청보리밭이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면 옥천 안남면 지수리 금강 청동여울의 봄이다. 나는 봄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가 굽이쳐 흐르는 금강에서 쏘가리 낚시를 즐긴다. 쏘가리 낚시꾼들이라면 지수리 취수탑을 알 것이다. 부연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길을 달리다 멀리 취수탑이 보이면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한다.
지난 봄, 취수탑 아래 강가에 한 백발노인이 앉아 낡고 엉성한 낚싯대로 무언가를 잡고 있었다. 물고기는 못 잡고 강물 위로 흐르는 구름과 바람과 봄볕만 빈 바늘로 건져 내고 있었다. 나도 쏘가리는 못 잡고 흔한 잡고기인 끄리만 계속 낚았다. 그러다 저쪽을 보니 노인도 끄리 한 마리를 잡은 듯했다. 나는 귀찮을 정도로 끄리가 덤벼들어 잡고 놓아주고, 또 잡고 놓아주면서 좀 짜증이났는데, 노인은 그 한 마리 낚은 게 전부였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노인이 낚싯대를 접더니 겨우 잡은 그 한 마리 맛없는 끄리를, 기생충 감염의 위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녹슨 칼로 회 떠 초장 찍어먹는 게 아닌가. 나는 미간을 찌푸리다 이내 노인이 측은해졌다. 그는 내가 팔뚝만 한 끄리 수십 마리를 잡았다가 다시 놔주는 걸 다 봤을 테고, 낡고 망가진 낚싯대와 빈 그물이 꼭 자신의 노쇠한 육체처럼 여겨져 쓸쓸했을 것이다.
나는 끄리 몇 마리를 잡아 노인에게 갔다. 도마에 묻은 핏물과 마구 썰어 뭉개진 회가 비위생적으로 보였지만 괘념치 않았다. 끄리회 한 점을 정말 맛있게 씹는 그에게 말했다. “끄리 회 맛있죠. 회 뜨기 좋은 놈으로 몇 마리 챙겼는데 혼자 먹기엔 많네요.” 큰 놈 세 마리를 건네고 자리를 떴다. 보리밭엔 초록 바람이 불고, 아카시아꽃 냄새가 머리칼에 배어 마음까지 향기로운 봄날이었다.
할머니는 요양 병원에 누워 지낸다. 할아버지 생전에 집에서 두 분이 국수를 종종 삶아 먹었다. 눈과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소면에 참기름과 간장을 잔뜩 부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국수를 만들었다. 나는 한 젓가락 먹고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할아버지는 그 국수가 제일 맛있다며 그릇을 다 비우곤 했다. 봄날 지수리에서 나는 애물단지 끄리 두 마리를 들고 터벅터벅 민박집 평상에 가 앉았다. 처치 곤란한 그 물고기에 칼집을 내어 소금구이를 했더니 꽤 고소했다.
저자 | 이병철님 / 시인
사진제공 ㅣ getty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