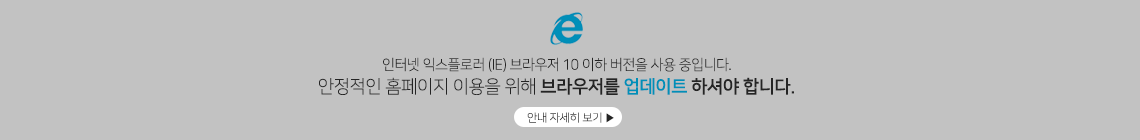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옛사랑> 시절의 한때
작성일2025년 11월 18일

‘옛사랑’이라는 명사 앞에서 ‘시절’과 ‘한때’라는 말이 불현듯 떠오른다. 두 말은 얼굴이 동그란 자매처럼 닮았다. 기억의 방에 세 들어 살기 좋아하는 말 같기도 하다. 나도 이 ‘옛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마음의 전부를 내준 때가 있었다. 당신의 과거를 질투하며,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며 거울을 자주 본 날들. ‘사랑했다.’라고밖에 적을 수 없는 젊은 시간이었다. 지금도 말하고싶다. 남김없이 고맙다고. 당신과 그 ‘시절’의 ‘한때’를 함께해서.
언젠가 나는 이런 시를 썼다. “헤어진 애인이 꿈에 나왔다/ 물기 좀 짜 줘요/ 오이지를 베로 싸서 줬더니/ 꼭 눈덩이를 뭉치듯/ 고들고들하게 물기를 짜서 돌려주었다/ 꿈속에서도/ 그런 게 미안했다(<오이지>).”
어떤 시간은 감각으로 정직하게 기억된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다. 손이 차다고 말하면 손깍지를 끼워 외투 주머니에 넣어 준 사람. 아프냐고 말하기도 전에 이마에 손바닥을 짚던 사람. 그 한 장의 온기를 선뜻 내밀 줄 아는 사람.
한데 이제는 안다. 기억이란 재편집되거나 달콤하게 몸집을 부풀리기 좋아한다는걸. 과거에 머무른 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상상 속 채색된 허상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립냐고 물으면 잘 살고 있다고 답할 것이다. 보고싶으냐고 물으면 다 지난 일이라 하겠다.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진 기억은 비슷할까?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대보듯 기억을 대본다. 완벽한 대칭일 리는 없겠
지만.
그날을 당신도 기억할까. 나는 가끔 그날 풍경이 떠오른다. 우리는 고물 선풍기를 틀어 놓고 밥을 먹었다. 무겁고 습한 공기와 가구에 밴 반찬 냄새, 모기를 잡느라 이따금 종아리를 찰싹 때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어떤 날은 반찬을 씹는 당신의 턱뼈가 안쓰러워 보였고 어떤 날은 그런 모습이 지겨워져 숟가락을 탁 놓았다. 땀으로 축축해진 감촉이 싫어 손을 빼서 바지
에 문지르기도 했고, 앞서가는 당신 발자국에 내 발을 포개며 걷기도 했다. 변덕 부리기 좋아하는 시간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다시 오지 못할 ‘시절의 한때’를 그대로 봉해야겠다. 굳이 매듭짓지 않고 내버려두리라. 그것이 지난 사랑을 대하는 지혜라면 이대로 깨끗이 지나가겠다.
저자 | 신미나님 / 시인
사진제공 ㅣ getty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