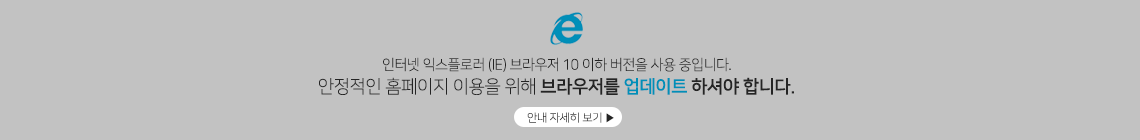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오늘의 만남> 새로운 산
작성일2025년 10월 20일

젊은 시절 원 없이 산에 올랐다. 한창 바위에 빠졌을 때는 일주일에 사나흘씩 출근하듯 산에 갔다.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 큰 산에 들어가면 보름씩 눌러앉아 나올 생각을 안 했다. 넉 달 가까이 지속된 히말라야 원정에 참가한 적도 있다. 당시의 산은 온통 능선과 바위만으로 파악되었다. 눈앞을 가로막는 절벽이나 아스라한 정상을 올려다보면 나도 모르게 아드레날린이 휘몰아치고 피가 끓었다. 후회는 없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고통의 축제’다.
청춘보다는 노년에 더 가까워진 요즈음에도 여전히 산에 오른다. 하지만 다른 산이다. 더 이상 바위 절벽에 붙어 버둥거리지 않고, 기어코 정상에 서야겠다며 발걸음을 재촉하지도 않는다. 계곡을 한 굽이만 돌아도 세상을 눈 밖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숨은 폭포와 마주치면 반갑게 유두(流頭,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를 하고, 맑은 계곡을 만나면 기꺼이 발을 씻을 뿐이다. 산 벗이 저마다 배낭에서 꺼낸 소박한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하릴없이 만끽하노라면 행복의 시간은 편안하고 유장하게 흘러간다.
절벽과 능선은 청춘의 경기장이다. 기를 쓰고 올라야 한다. 폭포와 계곡은 노년의 놀이터다. 더 이상 오를 필요 없다. 그저 흐르는 물과 아래로 잦아들면 그만이다. 생각해 보면 단순한 진리다. 누구나 자기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산행 또한 그러하다. 피 끓는 청춘이 산 아래 계곡에서 물놀이만 하다가 돌아선다면 어색하고 남세스러울 것이다. 힘에 부치는 노인이 바위에 매달려 안간힘을 쓴다면 그 또한 우스꽝스럽고 위험할 따름이다.
나는 나이 들어 만나게 된 새로운 산과 기꺼이 악수하며 살가운 눈웃음을 나눈다. 절벽 위와 산의 정상은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다. 이따금 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원지는 어떤 모습일까 싶다가도 젖은 발을 말리고 등산화 꿰신기가 귀찮아 그대로 뒤로 벌렁 누워 버린다. 흐르는 물소리가 귓가를 간질인다. 물가에 오래 살다 보면 가는귀를 먹는다고 한다. 세속의 저 번잡한 시시비비를 멀리하려면 그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다. 그냥 이대로 깜빡 잠이 들어도 좋을 듯하다.
세상이 꽃 같았다.
저자 | 심산님 / 작가
사진제공 ㅣ getty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