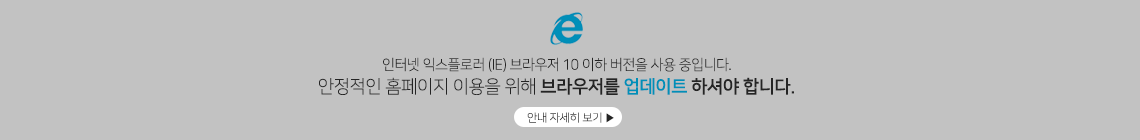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오늘의 만남> 나의 선생님, 시
작성일2025년 07월 01일

가끔은 시 한 편이 인생의 스승이 되기도 한다.
시라는 선생님은 정답을 콕콕 집어 주지 않고, 정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말들을 통해 답을 이해하게 한다. 말하자면 질문을 질문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속엔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 차곡차곡 쌓인다. 가슴에 질문을 가득 담은 사람을 향해 우리는 말한다. ‘저이는 참 시적인 사람이야.’
시적인 사람이려거든 누구에게든 많이 물어보고, 무엇이든 궁금해하면 된다. 참 쉽지 않은가.
이맘때만 되면 늘 찾아 읽는 시가 있다. 다니카와 슌타로의 〈네로〉라는 시다. 이 시에는 ‘사랑받았던 작은 개’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 개의 이름이 바로 네로다. 사랑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적은 걸 보니 현재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렇다. 이 시는 열여덟 번의 여름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단 두 번의 여름을 알았을 뿐인 작은 개를 떠올리는 시다. 죽은 생물을 그리워하는 생물의 사연은 모르긴 몰라도 무척 처연하다. 그런데 이 시는 그런 청승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푸릇푸릇한 삶의 감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죽은 개의 침묵과 “새롭고 무한하게 넓은 여름이 온다.”라는 살아 있는 인간의 말이 어우러져 읽는 이의 마음을 똑똑 두드린다. 생각의 문을 열게 한다.
나는 매해 여름 이 시를 읽으면서 깨치곤 한다. ‘올여름에도 나는 살아 있구나.’ 하고. 살아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묻는다. 나는 지난여름, 몇 해 전 봄, 그 계절에 떠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명인가, 하고.
그러니까 시 한 편은 어느 한밤 생과 사, 존재와 소멸, 부끄러움에 관하여 자문하게 한다. 이불 속에선 누구나 철학자이고 몽상가이며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실을 일깨워 준다.
얼마 전, 나는 두 명의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마음의 잡목 숲에 고개를 처박고 있던 내게 이제 그만 그곳에서 나오렴, 하고 말 건네준 것이 바로 작은 개, 네로, 시인, 시,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김현 님 | 시인
사진 출처 |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