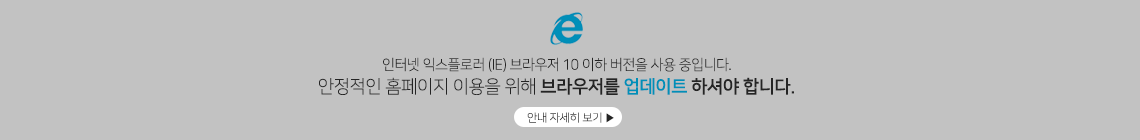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오늘의 만남> 부드러워지자
작성일2025년 04월 22일

봄은 내게 부드러운 촉감으로 기억된다. 잎, 줄기, 꽃 등 모든 것이 만지기 겁날 정도로 부드럽기 때문이다. 뾰족한 가시로 유명한 장미 줄기조차 새봄에는 말랑거리니 신기할 따름이다. 봄에는 촉감뿐 아니라 색상도 부드럽다. 선명하고 눈부신 연초록 잎은 굳이 만지지 않아도 촉촉함이 느껴진다.
봄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은 성장을 위해서다. 멈추지 않고 자라기 위해 식물들은 부드러움을 유지한다. 여기에 성장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숨겨져 있다. 마치 아기들이 태어날 때 더할 나위 없는 부드러움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명체는 부드러움을 잃어 간다. 죽은 나무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를 부러뜨려 보는 것이다. 생명이 있다면 부드럽게 휘어지지만 죽거나 병들었다면 딱딱하게 부러져 버린다.
우리 몸도 다르지 않다. 젊은 날의 몸은 부드럽지만 나이 들어 가며 딱딱해지고, 결국 생을 다하면 완전히 굳는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생명체가 거치는 이 과정은 나이 먹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배하는 노화의 길은 막을 수 없다.
조금 다른 차원의 해석도 있다. 수백 년을 사는 고목은 단단하게 굳은 기둥덕에 장수한다. 중력을 이겨 내고 튼튼히 뿌리 박을 수 있는 것도 이 딱딱함 덕분이다. 딱딱함은 안의 부드러움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부드러워야 성장할 수 있기에 늙음의 딱딱함을 잘 이용하는 셈이다.
오래된 나무와 고사목은 분명 다르다. 둘 다 딱딱하지만 살아 있는 나무는 그 안에 여전히 부드러움을 지닌 반면 죽은 나무는 그렇지 않다. 모든 생명체는 유한한 삶을 살며 필연적으로 늙지만 이 과정에서도 분명 시간의 양과 생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 있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화단을 정리하다 성큼 자란 튤립잎에 미소 짓는다. 지난겨울을 견딘 튤립 알뿌리의 인내력이 참으로 고맙다. 이런 생각도 해 본다. 육체의 늙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신만큼은 좀 더 부드러워지자. 그래서 이 찬란한 봄에 나도 튤립처럼 열심히 살아 보자, 그렇게 주문을 외운다.
저자 | 오경아 님 / 가든 디자이너, 작가
사진제공 ㅣ getty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