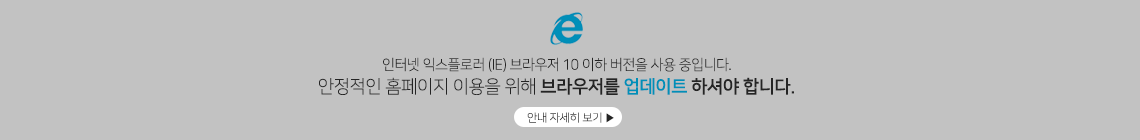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나의 글쓰기> 손바닥 자서전 쓰기
작성일2026년 02월 02일

1837년 10월 22일,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첫 장에는 “로마 황제의 방처럼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곳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와 마주하고 일기를 쓴다.”라고 적혀있다. 일기 속의 그는 들판과 풀밭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을 따라 걷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호수 안개 속에서 용해되는 자신을 꿈꾸기도 하고, 마을 아이들이 감자밭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고 바람에 실려 오는 사향 내음을 맡았다. 그는 모든 소리가 침묵의 하인이라는 걸 깨닫기까지의 과정을,
자연 속에서 몸이 어떻게 운율을 익히게 되었는지를 일기에 기록했다.
‘머스케타퀴드’호를 타고 2주 동안 여행한 경험은 그의 첫 책《 소로우의 강》의 토대가 되었다. 1845년 메사추세츠 콩코드 마을 근처에 있는 월든 호숫가 숲속에 살았던 2년 2개월 동안 쓴 일기는 불후의 고전《 월든》이 되었다. 그의 책과 강연의 바탕에는 일기가 있었다.
흔히 자서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일대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 한 권, 혹은 그 이상의 이야기로 채워야 한다고. 이런 선입견이 자서전 쓰기를 어렵게 만든다. 써 보기도 전에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다.
“내 얘긴 한 권으로 부족해.”라고 장담하던 사람들도 두세 꼭지 쓰고 나면 더 쓸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다. 작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삶의 커다란 굴곡들만 나열하다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자서전 쓰기 방법은 멀리서 산을 스케치하듯 전체 모양만을 보여 주는 꼴이다.
자전적 기록은 자기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삶이라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피는 일이다. 어떤 나무가 심겼는지, 병들어 말라비틀어진 나무는 없는지, 나뭇가지와 잎은 어떤 모양인지, 바람에 실려 온 냄새도 맡고, 새소리도 듣고, 숲을 뚫고 들어온 햇살의 모양도 살피는 일이다. 기억을 대충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자세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일이다.
자서전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 ‘자서전’이라는 말보다 ‘손바닥’이라는 말에 방점을 뒀으면 한다. 소로의 일기에 거대한 이야기는 없다. 지극히 사소한 얘기들로 채워졌다. 오히려 우리가 지나쳤을 법한 것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고정시켜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다. 그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소로의 철학을 만든거다.
우리의 기억에 남은 소소한 일상과 작은 사건을 떠올려서 ‘손바닥’ 같은 이야기를 쓰면 된다. 이야기가 커지려고 하면 ‘더 작은 것은 없을까.’ 하고 세밀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은 이야기가 모여서 결국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다.
큰 그림부터 만들어 놓으면 시작하기 두려울 수 있다. 작정하고 덤벼들어도 실패하기 쉽다. 기록하기 전까지는 자기 삶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 아무리 자신의 삶이지만 글을 쓰다 보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기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다 쓴 다음 이야기가 어떤 모습일지 조망해도 늦지 않다.
부디 ‘손바닥’ 같은 작은 글을 쓰자. 자꾸 이야기가 커지면 잠깐 멈추고 ‘손바닥’이라는 말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야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자. 카메라의 줌 렌즈를 이용해 피사체를 끌어당기는 기분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떠올리고, 글 속의 시간을 한정 지으면 가능하다.
일기가 그날을 기록한 것이라면 자서전은 밀린 일기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밀린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작하면 된다.
소로는 그의 첫 일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혼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연, 사람, 책에 대해 썼지만 결국 혼자가 된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한 셈이다. 그것도 지독할 정도로 면밀히.
글 _ 강진 님 | 소설가
사진 _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