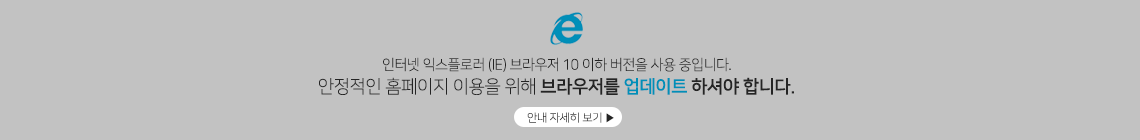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MAGAZINE] <오늘의 만남> 참새 침공
작성일2025년 10월 01일

후줄근한 옷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다.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손을 달라더니 작고 시커먼 무언가를 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총각이 잘 살려 줘.” 그러곤 부리나케 자리를 떠나 버렸다.
자세히 보니 가냘프고 지저분한 새끼 참새가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다. 아직 깃털이 다 나지 않고, 눈도 겨우 떴다. 그래도 살아 있다는 걸 알리기라도 하듯 녀석의 온기가 전해졌다.
어미를 찾아 줄 수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기에 내가 녀석을 돌보기 시작했다. 나와 아내는 천덕꾸러기 같은 녀석을 ‘천덕이’라고 불렀다. 새끼 참새는 아기와 다를 바 없어서 두어 시간마다 미숫가루와 달걀을 섞어 떠먹여 주어야 했다. 배가 고프면 짹짹거리는 통에 밤잠 못 자며 끼니를 챙겼다. 갓 창업한 회사에서도 동료의 눈치를 보며 녀석을 데리고 다녔다.
애지중지 살려 냈건만, 녀석은 염치도 없이 온갖 패악질을 했다. 당장 입고 나가야 하는 양복에 똥을 싸기도 하고, 내 눈을 쪼거나 밥을 빼앗아 먹기도 했다. 어찌나 성질이 고약한지.
사람 손을 탄 참새는 야생으로 돌아가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해서 내보내지도 못했다. 이 고생을 참 오래도 했다.
몇 년 지나고 보니 녀석이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처럼 박씨를 직접 물고 온 것은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에 복을 가져다주었나 싶다. 보잘것없이 창업한 회사가 번듯한 규모로 성장하고, 고질병으로 고생한 허리도 나았고, 독립해서 시작한 아내의 일도 승승장구했다. 심지어는 녀석의 이야기를 담은 책까지 내고 얼떨결에 작가 이름을 달았다.
녀석은 이제 다섯 살이 되었다. 참새 수명이 대개 육 년 정도라고 하니 함께할 날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 녀석이 나에게 왔을 때는 ‘천덕꾸러기’의 ‘천덕’이었지만, 지금은 한자로 하늘 천(天) 자에 덕 덕(德) 자를 쓴다. 녀석의 모습에 걸맞지 않은 거창한 이름이긴 하다. 그만큼 내가 천덕이와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글_유준재님 | 농수산물 유통업자
사진_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