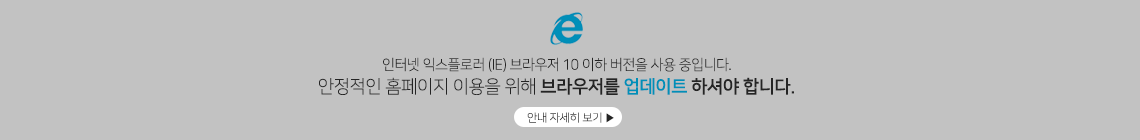[햇살 마루] 곁을 준 사람
이제 다섯 살이 되는 딸아이는 잠들기 전에 종종 책을 들고 내 방으로 와서는 읽어 달라 한다. 어느 날 함께 책을 읽는데 폭풍우와 번개가 나왔다. 아이가 번개를 무서워하기에 나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며 달랬다. 번개가 치는 날이면 불꽃놀이를 보듯 아빠와 함께 보자고 했다. 그러자 아이가 겁먹고 쓸쓸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그때 아빠가 없으면 어떡해?”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아버지는 내가 중학생일 무렵 트럭 행상을 시작했다. 워낙 소농이었던 터라 농사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나마 유일했던 두어 마지기의 논을 팔아 버린 뒤 1톤 중고 트럭을 구입했다.
트럭 행상이 만만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트럭을 몰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았지만, 농사를 짓던 때보다 살림이 나아지기는커녕 외려 기우는 듯했다. 아버지의 실패를 증명이라도 하듯 집 안 곳곳에 팔지 못한 물건만 쌓여 갔다. 옷, 그릇, 신발 따위가 쌓이는 건 그럭저럭 견딜 만했다. 이 모든 실패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아버지는 트럭 짐칸에 닭장을 짜고 닭을 팔러 다녔다. 그 닭의 대부분은 우리 집 닭장에서 늙어 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아버지는 트럭 짐칸에서 닭장을 헐어 내고 커다란 함지박에 닭 내장을 싣고 다녔다. 가스통에 주물 버너를 연결해 솥까지 얹었다. 이 장사가 시원찮았던 건 우리 식구에게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남은 닭 내장을 처분할 사람은 우리뿐이었기에 하루 세 끼를 닭 내장 볶음으로 때웠다. 얼마 못 가 닭이라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사춘기를 지나는 터라 무척 신경질적이었던 나는 기울어 가는 집안 형편이 한심하다 못해 불쑥불쑥 화가 치밀곤 했다. 이러다가 정말 집안이 꼴깍 몰락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두어 번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의 조수 노릇을 하며 트럭 행상을 따라다닌 적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장사에는 영 젬병이라는 걸 잘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트럭을 처분하고 오롯이 농사만 짓던 시절로 되돌아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식구를 먹여 살려야했기에 실패를 거듭해도 부단하게 새로운 상품을 물색했다.
어느 해 초겨울, 감기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를 따라나서야 했다. 아버지가 김장철 대목을 노리고 젓갈을 다루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깨어나 보니 이제 막 자정을 넘긴 참이었고 바깥은 옴팡지게도 추웠다. 조수석에 오른 나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아버지가 졸음을 몰아내려는 듯 이따금 손바닥으로 눈두덩을 문지르는 걸 보았다. 두어 시간을 달려 여수 수산 시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새벽이었다. 아버지가 경매로 젓갈을 구입하는 동안 나는 조수석에 그대로 남아 달달 떨면서 자다 깨다를 되풀이했다.
어느새 희부옇게 먼동이 터 왔고 트럭 짐칸에 여러 종류의 젓갈 상자가 그득 쌓였다. 그때부터 장사는 시작인 셈이었다. 여수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국도 변 모든 마을에 들러 젓갈을 팔았다. 마을 회관에 트럭을 세우면 아낙들이 나와 젓갈을 살펴보며 흥정을 했고, 거래가 이뤄지면 아버지와 나는 젓갈 상자를 어깨에 지고 그 집 부엌까지 옮겨다 주었다. 젓갈 장사는 제법 성공적이어서 오후 무렵에는 몇 상자밖에 남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이미 젓갈 냄새에 흠뻑 젖었다.
어느 마을에서 눈 밝은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다. “오메, 아저씨! 손가락은 어찌된 거라우?” 나는 퍼뜩 정신이 들었고 곁눈질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흔흔했다. “탈곡기에 먹혔어라우.” 혀를 차던 아주머니는 나를 힐끔 보았다. “아들이어라?” “예, 아들이어라.” “아따, 야무지고 똑똑허게 생겼다. 든든허시겄어라.” 그 말치레에 대답하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얼굴은 오후의 식은 햇살 아래서도 유난히 해사했다.
겨울 해는 짧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으나 아버지는 트럭 짐칸이 텅텅 비었으므로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항하는 어부처럼 흥겨워했다. 나는 귓가에 맴도는 아주머니와 아버지의 목소리를 곱씹었다. 문득 그날 새벽 아버지가 경매로 젓갈을 구매하는 동안 조수석에 혼자 남아 자다 깨다를 되풀이하면서도, 어둠에 잠겼던 바다가 기지개를 켜며 부풀어 오르는 걸 보았음을 깨달았다. 운전석에 올라타던 아버지에게서 이미 물씬 밴 젓갈 냄새를 맡았던 것도 깨달았다. 잠든 나를 깨우지 않기 위해 홀로 트럭 짐칸에 그 많은 젓갈 상자를 실었던 아버지,젓갈 냄새를 조금이라도 털어 버리기 위해 차가운 바깥에서 한동안 바람을 맞으며 기다렸던 아버지, 그러면서 조수석 차창으로 잠든 나를 들여다보았을 아버지가 선연히 떠올랐다.
내가 잠든 동안에도 나를 지켜보던 누군가는 아버지일 수밖에 없었고, 나는 비몽사몽간에 아버지와 시선을 맞추고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거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옆얼굴을 보았다. 아버지는 멀리 떠나는 중이었다. 탈곡기에 손가락을 잃은 뒤 천천히 조금씩 거기에서 멀어지는 중이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섭고 쓸쓸해서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였다. 다시는 손가락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당신이 떠나온 그곳, 오롯이 농사만 짓던 시절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을 품은 채 당신이 잘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럭 행상이라는 미지의 세월로 끈질기게 항해해 가는 중이었다.
손홍규 님 | 소설가
 [오늘의 만남] 한옥 개구리 '마이삭'
[오늘의 만남] 한옥 개구리 '마이삭'나는 서울 종로구에 한옥을 지어 살고 있다. 종종 “한옥에 살면 어떤 점이 좋아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여러 가지 중 하나만 꼽자면 평범한 순간조차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는 점이다.햇빛과 한옥 창호가 만나 생기는 그림자를 온종일 관찰하기도, 기와 끝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며 쌓이는 빗방울과 눈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기도 한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된다.작년 늦여름,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는 조금 무서웠다. 태풍이 끌고 온 비가 나의 작은 마당으로 무섭게 퍼부었다.태풍이 지나가고 마당 화단에 심은 나무들을 살피며 주변을 정리하는데 수풀 더미에서 갑자기 무언가 튀어 올랐다. 깜짝 놀란 나머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들고 있던 쓰레기통과 함께 나뒹굴었다.‘뭐지?’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처를 살폈다. 성인 엄지손가락 두 개 정도 크기의 개구리였다. 너무 황당했다. 갑자기 개구리라니? 보는 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덩치는 곰만 한 남자가 혼자 놀라 자빠진 모습이 어이없었다.한옥을 나서면 그래도 도시니 저 멀리 북악산에서 내려온 개구리도 아닐 테고, 이미 초가을이라 땅속에서 자다가 뒤늦게 일어난 개구리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다 큰 개구리가 태풍이 지나가고 마당에 나타났으니 가장 합리적인 추론 같았다.그 뒤로 며칠간 보이지 않더니 완연한 가을날,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즐길 때였다. “꾸륵꾸륵.” “뭐야, 갑자기?” 놀랍게도 개구리 울음소리였다. 녀석은 내 옆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봄, 녀석은 다시 화단에 나타났다. 이제 나는 화단에 떨어진 풀잎을 일부러 치우지 않고, 집을 오래 비워야 하면 풀 더미가 건조해지지 않게끔 물을 흠뻑 뿌리곤 한다. 녀석에게 작년 태풍 이름을 따 ‘마이삭’이라는 이름도 붙여 주었다. 나는 고요한 한옥에서 이따금 “꾸륵꾸륵.” 하고 우는 마이삭과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전상진 님 | 영상 감독, 한옥 컨설턴트원고 응모 정기 구독
 [좋은님 에세이] 특별한 오늘
[좋은님 에세이] 특별한 오늘얼마 전 친구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친구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실크 스카프를 발견했다.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처음으로 준 선물인데, 아내는 특별한 날 쓰겠다며 아껴 뒀단다. 친구는 아내가 고이 보관한 스카프를 안고 몸부림치다 산소로 달려갔다. 스카프로 봉분을 감싸고 한나절을 울었다고 했다. 친구는 말했다. “소중한 것을 아껴 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 우리가 살아 있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야.”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나야말로 오늘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매일 특별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 작년 말, 해맞이하러 정동진에 갔을 때가 떠올랐다. 검푸른 동해에서 불끈 솟는 찬란한 해를 보며 뭉클했는데, 그 해를 매일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웠다. 그날 퇴근길,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이야. 여섯 시 삼십 분까지 일식집으로 오세요.” 무슨 일인지 묻지 못하게 휴대폰 전원을 끄고, 아내가 좋아하는 안개꽃을 한 다발 준비했다. 식당 로비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즐거운 상상에 젖었다. ‘아내가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뭐라 답할까?’ 꽃다발을 든 나를 발견한 아내는 눈을 크게 떴다. “여보, 내 생일은 다음 달인데?” 내가 머뭇거리자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외쳤다. “자기, 영전했구나? 축하해!” 아내 눈가가 촉촉이 젖어 들었다. 나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안기며 속으로 되뇌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야.’ 정하득 님 | 충북 진천군원고 응모 정기 구독
 [특집] 대추가 영어로 뭐예요?
[특집] 대추가 영어로 뭐예요?“선생님이 이것도 몰라요?” 어쩌면 내가 가장 듣기 두려워하는 말이다. 아이들에게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는 생각은 완벽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져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 연기하게 했다.“선생님, 대추가 영어로 뭐예요?”“아, 대추? 대추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는 거라 영어로도 그냥 대추라고 하면 돼. 떡볶이는 ‘tteokbokki’, 태권도는 ‘taekwondo’라고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훅 들어온 학생의 질문에 이렇게 둘러댄 날이 있었다. 누가 또 질문할까 봐 서둘러 교무실로 달려온 나는, 당장 인터넷 영어 사전에 대추를 검색해 보았다. 제발 영어로 된 단어가 없길 바라며. 그러나 야속하게도 ‘jujube’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영단어 짝이 있었다. “선생님도 이 단어는 잘 모르겠네. 같이 찾아볼까?” 이 한마디면 될 것을. 나는 ‘모른다’는 그 한마디를 꺼내기 싫어 아는 척, 태연한 척 연기하느라 애쓰곤 했다. 스스로가 부끄럽고 한심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나는 내 수업에서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었을까? 그저 빈틈없는 선생님이 되려고 애쓸 뿐,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이며 먼저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다가간 적이 있긴 했나?’ 그날 이후, 나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전문성이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실력 없는 교사라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스쳤지만, 내 모습 그대로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기로 했다. 어쩌면 내가 내보인 그 틈으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관한 물음이었다. 나는 용기 내어 내 틈을 드러냈다. “사실 잘 모르겠어. 우리 같이 찾아볼까?”“이거 중학교 과학 내용인데 몰라요?”“응. 사실 선생님이 중학생 때 영어만 좋아하고 수학이랑 과학은 못했어.”“진짜요? 대박. 선생님은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멋진 설명을 기대했는지, 아이들은 실망한 듯도 하고 놀라 보이기도 했다.“모든 과목을 잘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 선생님 중학생 때 과학 30점 맞은 적도 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선생님 됐잖아. 너희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와, 쌤 멋져요!”빈틈을 내보였는데도 창피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빈틈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통로가 된 것 같아 행복했다. 그동안 나는 지식으로 단단히 무장하면 아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내 빈틈을 메우려고, 때로는 가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아이들과 만나는 횟수가 늘수록,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사는 완벽한 교사가 아님을 깨닫는다. 오히려 그런 완벽함이, 또는 완벽해 보이려는 노력이 아이들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은 아니었을까. 빈틈을 인정하고 기꺼이 내보이는 용기, 어쩌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사론 님 | 전북 전주시 원고 응모 정기 구독
 [햇살 마루] 당신은 어떤 손을 가졌습니까
[햇살 마루] 당신은 어떤 손을 가졌습니까요즘 남편은 텀블러를 들고 출근한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보겠노라는 결심이다. 그러다 보니 종종 남편의 텀블러를 세척할 일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내가 만지기만 하면 뚜껑 부품 하나가 빠졌다. 이거 또 이러네, 고개를 갸웃하니 남편이 그런다. 또? 하여간에 가시손이라니까.가시손이라니, 그런 말은 처음 들었다. 사전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때리는 느낌이 찌르는 듯한 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북한 말이라는데 도대체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아무려나 만지기만 하면 뭐든 잘 고장 내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연년생인 언니의 물건은 십 년을 써도 새것 같은 데 반해 내 것은 아니었다. 손끝만 스쳐도 꼭 표가 났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불가능했다. 언니 옷이나 신발을 몰래 착용하고 외출한 날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었다고 한다. “야, 안희연, 너 이리 안 와? (이하 생략)”억울함이 없는 건 아니다. 나라고 일부러 망가뜨리고 싶었겠는가. 훔쳐 입은 옷임을 매 순간 자각하며 극도로 조신하고자 애썼음에도 하필 그때 가슴팍에 빨간 양념이 튀고 흰 운동화가 사람들 발에 밟히는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이왕 억울한 김에(?) 가시손의 동지들을 떠올려 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가 떠오른다. 엘사는 만지는 것마다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무서운 손을 가졌다. 엘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장갑을 끼고 얼음 성에 갇혔지만, 동생 안나의 활약으로 봄의 왕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영화는 분명 해피 엔딩이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가시손의 주인인 나는 엘사에 극도로 감정 이입을 한 나머지 극장 불이 켜진 뒤에도 얼음 성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엘사의 생애를 놓고 봤을 때 얼음 성에 홀로 유폐된 시간은 겨우 한 조각의 과거겠지만, 그 한 조각이 집채만큼 커져 엘사의 남은 인생을 뒤흔드는 순간이 정말 없을까. 기억이란, 시간이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것. 아마도 엘사는 홀로였던 순간의 추위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영화 〈가위손〉의 주인공 에드워드는 어떤가. ‘사랑을 만질 수 없는 남자’라는 포스터 카피에서부터 이미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 화면에 뾰족한 가위 손을 가진 그가 등장했을 땐 눈물을 줄줄 흘리고야 말았다. 손이 너무 차가워 보였기 때문이다. 저 마음 내 알지. 손이 가위인 슬픔 내가 알지. 사랑하는 사람을 코앞에 두고도 얼굴 한번 쓰다듬지 못하는 그가 너무 고독해 보였다. 다행히 영화는 한 사람의 불행과 고립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을 재치 있게 돌파해 나간다. 그가 가위 손의 장기를 살려 정원의 나무들을 사슴으로, 공룡으로 만들었을 땐 얼마나 환호했던지! 그 장면은 무척 아름다워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한다. 가위 손의 주인 에드워드는 훌륭한 정원사가 되어 불행에도 쓸모가 있음을 멋지게 증명한 셈이다.제가 이래요. 저한테 오면 전부 망가져 버려요. 얼마 전 한 드라마 남자 주인공도 연인에게 그렇게 이별을 고했더랬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가시손으로서의 정체를 고백하며 하루빨리 그녀를 보내 주는 일이었다. 그라고 왜 사랑받고 싶지 않았겠는가. 내 삶은 물론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니 가시손의 동지들이여, 어쩌겠는가. 비록 우리가 가진 건 가시손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섬세하게 살피고 조심하는 수밖에. 그나저나 가시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아마도 쓸어 담고 쓰다듬고 치료하는 손이겠지. 다행히 세상엔 가슴팍에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듣거나 진맥을 짚어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손도 존재한다. 내가 무수한 ‘나’의 총합이듯, 나의 손안에도 무수한 손이 자리할 것이다. 그러니 가시손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서 한평생 ‘파괴지왕’으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닐 터. 연습하는 손은 게으른 손을 이길 테고 호기심 가득한 손은 나태한 손을 앞설 것이다. 그래서 묻는다. 오늘, 당신은 어떤 손을 가졌습니까? 그 손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뜻합니까? 안희연 님 | 시인원고 응모 정기 구독
 [동행의 기쁨] 나에서 우리로
[동행의 기쁨] 나에서 우리로“학교에 다닌 것 같아요.”구범준 님(50세)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에서 보낸 10년을 되돌아보며 말했다. 세바시는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식 강연 프로그램이다. 한 사람당 15분 내외로 스튜디오에서 강연을 하고 그것을 방송으로 제작한다. “제가 신입 피디 시절에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교 4년간 전공으로 배운 지식을 방송국에 와서 곶감 빼 먹듯 쓰며 일하다 보니 고갈되는 느낌이라고요.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인 듯하다고요. 그런데 저는 세바시를 만들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니 세상을 보는 지평이나 관점이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넓어졌다는 건 그만큼 배웠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유명인이 나오는 강연 프로그램과 달리 세바시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사업가, 청년, 사회 운동가, 정신과 의사, 주부 등 여러 분야의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세바시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강연 콘텐츠는 보통 ‘What(무엇)’을 강조해요. ‘누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멋지게 합니다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Why(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왜 세바시를 만들었을까요?’라고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죠.” 발전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삶에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주변과 나눔으로써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믿는다.세바시에는 거창한 강연자 소개도, 화려한 장면 효과도 없다. 첫 회부터 1,300회가 넘는 지금까지 카메라 앵글, 진행 방법 등이 동일하다.누군가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 사람들은 똑같은 걸 싫어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말했다.“첫 회부터 지금까지 세바시의 방향성은 같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덕분에 세바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고마운 일이에요. 변한 게 있다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죠. 세상이 바뀌는 만큼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달라지는 거예요.”강연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축약해 편집한 콘텐츠를 보여 주는 다른 강연과 달리 세바시는 전체 내용을 공개한다. 어떤 강연은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람들에게 회자된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강연이 그랬다.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습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때로 가려움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극심하다. 겪어 보지 않은 이들은 그 아픔을 가볍게 생각하기 십상이다.아토피 피부염 환우 정원희 님이 치료 과정과 힘듦을 털어놓았고, 아토피 질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은 조재헌 님도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래퍼 씨클 역시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며 그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한 경험을 나누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사람들은 ‘나도 그랬다’며 댓글을 달고 정보를 공유했다. 그 관심은 일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질환에 대해 제대로 물어볼 곳도 없었대요. 저희가 이야기장을 마련한 거죠. 그 고통을 몰랐던 사람들도 강연을 들은 후 관심 어린 눈길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심리 기획자 이명수 님의 강연 ‘내 마음이 지옥일 때’도 참여자와 시청자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명수 님은 강연에서 말했다. “지옥에 빠지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그 지옥에서 잘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가 그 말에 위안을 얻었다.“이야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단독성과 보편성이에요. 좋은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다양한 삶이 있구나. 그 삶이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를 깨닫게 해요.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흥미를 덜 느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나에게 조언하는 듯하거든요. ‘저 사람의 삶은 나와 다르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 봐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공감하면 행동이 변해요.”세바시의 슬로건은 ‘나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이야기’다. 누군가가 털어놓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태 몰랐던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로잡는 일로 확장된다.“백 년 전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살기 좋아진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오백 년 뒤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인권, 젠더, 빈곤 등 여러 문제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가 남은 한 더 나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도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세상을 바꾸는 15분’ 앞에는 어쩌면 ‘나의’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나의 세상이 바뀌면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글 _ 정정화 기자, 사진 _ 케이이미지원고 응모 정기 구독
 [새벽 햇살] 편지들
[새벽 햇살] 편지들티브이나 신문 기사에서 음주 운전 사고 소식을 접하면 지금도 손발이 떨린다. 나는 지난날 지인의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가 되었다. 연이어 사업마저 실패해 몸과 마음에 병이 들었다. 자포자기하며 술에 의지하다가 음주 운전을 저질러 수감되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다. 생계 수단이 없는 가족을 벼랑으로 몰아넣은 부끄러운 가장이라며, 매일같이 자신을 탓했다. 어느 날 중학생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다. 아들은 편지에 자신의 손을 그리고 이렇게 썼다. “아빠! 내 손 잡는 거 좋아하지? 비록 그림 속 손이지만 이거라도 잡아. 아빠, 힘내. 사랑해!” 아들의 애틋한 마음에 울고 말았다. 기울어진 형편에도 묵묵히 살아가는 아내와 두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대학 친구와 선배가 보낸 편지에는 충고와 나를 믿는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연로한 어머니가 아픈 몸으로 매주 한 번씩 꼬박꼬박 보내는 편지에서는 회한과 눈물이 묻어났다. 어머니의 편지는 불효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죄를 반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힘든 시간을 거쳐 값지고 기쁜 미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반성과 참회를 통해 훗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여전히 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바르게 살 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리라. 나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며, 일어서는 용기를 배운다. 새벽 햇살 책 후원 바로가기